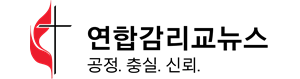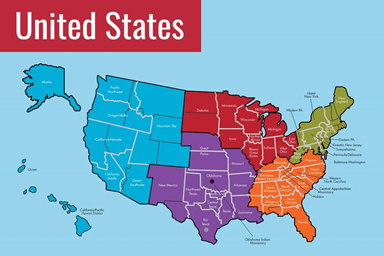이정용 신학은 아직도 유효한가?
1. 들어가면서
 임찬순 목사. 사진 제공, 임찬순 목사.
임찬순 목사. 사진 제공, 임찬순 목사.신학이라는 말을 동양, 특히 한자권 문명의 동아시아적 사유의 틀 안에서 어원적이고 실존적 의미로 풀어보고 싶다. 그것은 그냥 번역어일 수가 없고, 삶의 언어로 성육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학(神學)의 한자를 문자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음양 운동 현상에 대한 배움과 연구의 여정으로 보인다. 동양적 의미의 신 체험을 의미하는 신(神)은 보일 시(示)자와 펼 신(申)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부수 시는 어떤 하나의 계시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지는 계기를 형상화한 글자다. 옆에 붙은 펼 신은 ‘enfold’ 즉 주름을 펴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이다. 그러니 귀신 신(神)자는 하늘의 계시가 펼쳐지는 현상, 즉 동양적 신 체험을 대변하고 드러내는 글자다. 기가 막힌 텍스트적 표현으로 역의 현상이 펼쳐져 드러나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다. 학(學)은 배움과 깨달음의 여정으로 해석하고 싶다. 즉 신학은 동양적 맥락에서 본다면, 하늘적 계시로서의 신 체험을 붙잡고 살아가는 배움과 연구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양적 맥락에서 신학은 하나님(Theos)을 이해하기 위해 이성적 논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logos’의 길이지만, 동양적 맥락에서의 신학은 서구적 신학과는 결을 달리하는 삶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드러내는 여정이다. 서양적 맥락에서의 신앙과 로고스라는 태생적으로 안 어울리는 조합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여여하게 드러나는 동양적 신학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그런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 체험과 그것을 해명한다는 의미에서는 결을 같이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종교학이나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서양학자들이 종교와 신앙을 로고스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The Way of Life)으로 학문적 정의를 새롭게 하는 현대 학문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그렇지만 신학은 개인의 실존적 여로에서 시작해야 하는 자서전적 서술일 수밖에 없다. 이정용의 하나님은 증조할머니의 하나님이었고, 어머님의 하나님이고, 아버님의 하나님이었다.
한반도에서, 그것도 평안남도 순천(順天)군 자산(慈山)면 향(香峰)리에서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종산의 땅을 바쳐 교회를 세웠던 증조할머님과, 그분의 뜻을 지성으로 받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북한 땅에 남아 아기를 낳아야 했던 친척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사랑으로 희생했던 어머님과, 아펜젤러에게 세례까지 받았으나 한반도에 태어난 인연을 놓지 못해 회심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어설픈 세례교인 아버님의 하나님이었다.
이정용의 삶의 자취에는 하늘에 대한 자연스러운 흐름, 사랑의 산과 제사를 드리는 향을 피워 올리는 봉우리 속에서 잉태된 거룩함과 신학이 연결되어 있음을 읽게 된다. 그런 한반도 땅에서 태어나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나라를 잃고 고난의 십자가의 땅이 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정용, 그의 신학은 자신의 자서전적 고백으로 쓰여진 신 체험의 텍스트일 뿐이다.
이정용의 신학은 우주종교의 예언자요 시인이요 이야기꾼이었던 그분의 배움과 깨달음의 여정에서 나온 텍스트이다. 그 텍스트는 우주와 역사, 시간과 세계, 나와 세상을 묶고 해명하는 운동으로서의 변화(역)의 여정일 뿐이다. 종교와 신학은 신비적 실재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인식을 몸으로 써가는 고백적 텍스트일 뿐이다. 텍스트는 직조된 날줄과 씨줄의 음양 운동인데, 그것은 심층심리학적 인식의 드러남, 내면적 과정(inner process)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즉 내면화 과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실재가 되는 여정인 것이다.
결국 이정용의 신학은 하늘의 엉성한 그물코다. 노자가 말했듯이 어떤 것도 이 어불성설의 그물코를 벗어날 수 없는 천망(天網恢恢 疎而不失, 노자 73장)인 것이다. 엉성하나 그 그물코에는 모든 것이 얽매일 수밖에 없는 신비가 출몰하는 것이다.
그의 신학의 텍스트는 관상기도적 텍스트일 뿐이다. 쉬지 않고 드러나는, 결코 같지 않은 반복과 영겁회귀의 관상적 접근은 묵상과 명상의 기도로 써진 신학적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그의 신학적 작업은 이성적 전개나 구성이 아니라, 기도의 대안 활동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신학의 길, 목회의 길을 가고 싶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았고 성경이 좋았고 교회가 좋았다. 한반도 구석진 땅, 당진까지 찾아온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신학적 여정은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일 뿐이다. 그분들을 해명하고 이야기하는 데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직조로 짜는 텍스트여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그것이 한국적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소명이었고, 그 길에서 이정용을 만났다.
이 에세이에서 이정용 신학의 언어와 개념 몇 가지를 하나의 텍스트로 엮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가 앞으로 도래할 지구촌 기독교(Global Christianity or World Christianity)를 위한 우주종교(Cosmic Religion)의 예언자였음을 알리고자 한다.
연합감리교회가 분열의 파열음을 내면서 혼란의 종말론적 상황을 지나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인지 아니면 헌 하늘과 헌 땅의 붙박이로 그칠지 그 미래를 알기도 어렵다. 이 카이로스적 시간의 냄새를 맡으면서, 한국 감리교인의 운명과 소명을 이정용이란 신학자의 텍스트 속에서 읽어보고 싶은 것이다. 거룩한 대화와 회합의 한 계기일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2. 하늘을 껴안는 엉성한 그물코(天網)-이정용 신학의 정체성: 우주종교에서 우주론적 인간학까지
독일 감리교계 연합형제교단(United Brethren) 목회자 자녀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대학인 오터바인 대학에서 이정용이 처음으로 출간한 책은 <나: 기독교적 인간 개념(The I: a Christian Concept of Man, NY: Philosophical Library, Inc., 1971)>이었다. 그의 초기 강의를 발전시킨 것이다.
그는 이미 이 책에서부터 신정통주의자인 바르티안(Barthian)으로 시작한 그의 신학적 여정의 처음과 끝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정용의 신학적 출발점은 기독교적 자아(The I)에 대한 인간 이해였음을,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신학을 시작했던 1960년대 말 그 시기에 신학이 신정통주의와 실존주의에 깊게 물들었던 상황과도 연관이 있는데,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극복, 형성의 과정에서 신학의 길을 새롭게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그의 초기 신학적 텍스트다. 이 시기의 그는 어쩌면 포이에르바하가 선언한 “신학은 인간학이다”라는 명제에 충실한 신학의 결을 갖고 있다.
이정용은 언제나 당당했고, 겸손했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시대 신학의 최고봉 칼 바르트를 사사했기 때문이고, 그가 자신의 신학적 여로에서 발견한 우주적 텍스트인 주역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칼 바르트에게 직접 배운 것은 아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숙이겠지만 그가 박사과정을 끝내기 전에 처음으로 출간한 논문이 “바르트의 교의학에서 유비론의 사용”(Karl Barth’s Use of Analogy in his Church Dogmatic,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XXII.2, June 1969: 129-151)이고, 그의 박사학위 논문(God Suffers for Us: A systematic Inquiry into a Concept of Divine Passibilit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4)과 교수가 되기 위한 시험 강의 주제도 칼 바르트의 신학이었던 것을 종합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바르트는 주역을 붙잡은 이정용을 나무라지 않았고, 자기 신학의 논리적 귀결이었다고 인가해 주었다. 이정용은 신정통주의와 동양 신학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랬기에, 이정용은 하나님의 신비를 해명하는 데 막힐 것이 없었다.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는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업고 갔던 것처럼, 주역과 동양철학을 업고 자신만만할 수 있었다. 그에게서는 치밀한 철학적 사고의 전문가가 아니라 도인의 풍모와 군자의 여유로움이 기독교적 영성가의 이미지와 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정용의 신학적 텍스트 속에서는 서양 신학과 그의 고향 한반도가 조우했기 때문이다. 몸과 맘이 연합이 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고 거칠 것이 있겠는가? 그가 붙잡았던 주역은 아버님이 공부하라고 권유한 텍스트였음에랴? 그의 신학적 텍스트는 그의 몸과 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치와 연합의 길이었다. 아버님과의 화해가 일어나고 고난과 고통의 땅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실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그의 신학적 고백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의 신학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를 겁 없이도 오갔던 한반도 초기 기독교인인 아버지와의 화해의 텍스트였고 그의 개인적 여로, 즉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였고 또한 영적인 아버지였다. 그는 결코 그 아버지를 홀대하지 않는 신학의 길을 갔다. 그의 신학의 길은 바르트의 ‘신앙과 관계의 유비론(Analogy of Faith and Relation)’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궤적을 그리게 된다.
그의 신학적 작업은 주역에서 말하는 때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생생지를 이름하여 역(生生之謂易)의 길이 된다. 그의 신학적 여정의 초기 오터바인에서 주역을 읽으면서 신학적 상상력으로 창안했던 우주종교(Cosmic Religion)는 그의 신학적 여정의 후기 드루에서 썼던 텍스트로 가게 되면, ‘우주론적 인간학(Cosmological Anthropology)’으로 신학을 정의하면서 성장해 갔다. 그 우주론적 인간학은 마지널리티에서 일어나는 나(이정용)의 운동이요, 변화의 길이기도 했다. 우주와 인간은 분리되지 않은 채 조화와 화해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이 신학의 여로가 된 것이다.
그는 바르트에게서 가톨릭과 기독교 전통의 자연신학과 결별하면서 걸어간 “관계와 믿음의 유추론”을 읽었고, 그 길이 이정용의 신학적 방법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의 신학적 텍스트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의 무의식 세계를 끌어올려 추적해 보면, 음양의 텍스트로 짜여진 하나님의 신비를 동양적 유비론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역을 일종의 칼 바르트의 믿음과 관계의 유비론과 결을 같이하는 우주적 유비론으로 읽은 것이다. 그는 주역을 신학적 해석학으로 읽는 태도를 견지한다. 그는 칼 바르트의 신학으로 따져봐도 자신이 하는 신학적 작업이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이정용의 신학은 주역에 대한 일종의 신학적 해석학이다.
이정용의 신학적 방법론을 뭉뚱그려서 말해보자면, 양자택일의 사고(either/or way of thinking)와 양면긍정의 사고(both/and way of thinking)의 역동성으로 “넘어”(beyond)의 엉성한 그물코를 만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물론 이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가능성에 열려 있기는 하지만 서구의 어떤 신학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전문가의 길이 아닌 일반론자(generalist)의 어설픈 그물코인 천망인 것이다. 그는 그가 공부한 서구 신학의 모든 논의를 일별하고서 문제를 파악했고, 동양적 사유, 일종의 동양적 신비적 사유인 주역의 논리로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바르티안 이정용에게 찾아왔다. 그것은 그의 속에 하나님 체험이 여여(如如)하게 자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3. 나(The I)와 나의 원형인 완전한 변화의 도(The I)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만남
나와 나의 원형인, 완전한 변화의 도가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만남
신학이 자서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변화의 실재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한정적 존재에 의해서 수행되는 신학적 씨름을 드러내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나(I)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했을 때, 그분의 우주적 나는 하나님의 실재를 드러내는 언어일 뿐이고, 그 존재는 예수라는 역사적 존재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언어 자체는 진실한 고백인 것이다. 그렇기에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해체되지 않는 고백의 텍스트이다.
이정용은 우주종교에서 우주론적 인간학으로 신학을 정의하는 포스트모던적 텍스트론자로서 자기 고백의 언어를 토해냈다. 그는 그리스도를 “완벽한 변화의 도”(The perfect realization of the Change)로 규정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웨슬리안으로서 이정용의 화룡점정이었다. 이것은 기독교적 완전을 놓지 않았던 웨슬리의 환생적 개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이정용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 체험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은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이어서 언어의 얼개로 걸러내기가 쉽지 않았다. 서구 신학의 언어로는 자신을 담아낼 수 없다는 깨달음은 그에게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주적 언어와 텍스트를 얻게 된다. 언어를 넘어서는 텍스트 시대의 도래를 예언함으로써, 한편으로 종말론적 현상이기에 "포스트"라는 개념을, "탈"과 "이후"를 지시하는 접두어를 붙이는 것이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개벽의 텍스트가 열리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지구촌 기독교의 도래를 외치는 아시아의 황야를 달리던 이정용의 광야의 소리로 듣고 싶은 것이다. 그는 서구적 기독교의 길을 가는 것을 단념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간 것이다.
이정용의 신학의 길은 자서전적인데, 여기서 자서전이라는 의미는 자기에 충실한 현대적 개인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주적 관계를 맺은 우주론적이고 종교적인 자아다. 이 자아의 자서전적이라는 의미는 서구적 개인적 실존적 자아의 자서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주적 관계를 맺으면서 성숙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신적 자아의 변혁 운동을 지칭하는 역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의 실현을 중시하는 서구적 인문학적 자아라기보다는 우주적 겸손을 지향하는 역적 자아의 우주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이정용의 신학은 이 부분에서 내적 과정이라는 내면화의 길, 즉 영성의 길을 지향하게 된다. 이제까지 서구 신학의 길을 완벽하게 뒤엎는 지난한 혁명의 길을 지향하게 된다. 신비의 길이고 영성의 길이고 내면화의 길이었다. 정의의 길이라기보다는 사랑의 길이었다. 해방의 길이라기보다는 내면으로 더 깊이 향하는 여정이었다. 그 하나님은 외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관계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골방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랑의 길이었다.
이정용은 서구화와 서구적 논리의 길을 따르는 배타적 종교의 길로 가는 기독교를 경계했다. 그것은 분열과 적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런 배타적 태도에서 찾았다. 그것은 사랑과 공감의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서구화되면서 노출시킨 근원적 병인이었다. 이것의 치유는 동양적 포괄적 태도로의, 사랑의 길로의 회귀 이외에 다른 길은 없었다. 그것은 주역을 통한 우주론적 회복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돌아가는 내적 과정의 길이기도 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외재화의 길을 회개하고 돌아가는 내면화의 길이기도 했다(Patterns of Inner Process, Secaucus, NJ: The Citadel Press, 1976).
하나님을 외부에서, 제도 속에서, 그리하여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만나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길이 예수 복음의 내적 의미를 상실한 길이었다고 이정용은 단언하게 된다. 초기에는 다소 엉성한 논리로 구성되었다면, 후기에는 풍성한 이야기들로 다소 신학적으로 세련되게 발전해 간다. 그렇지만, 다소 어설픈 천망의 논리와 그물코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것은 내면세계로 찾아오는 우주적 그리스도와 우주적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완전한 변화의 도의 실현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것을 실존적으로 적용한다면, 웨슬리적 기독교적 완전과 동양적 역이 만나는 길이기도 했다. 그것을 다시 한걸음 진전시킨다면 한국교회와 한국감리교회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한 것이다.
4. 포스트 연합감리교회 시대가 열리는 종말의 자리에 서서
 연합감리교뉴스에서 제공하는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연합감리교뉴스에서 제공하는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한국교회와 한국감리교회는 지구촌 기독교를 탄생시킬 계시적 사건이어야 한다. 이정용은 그 우주종교와 우주론적 인간학, 어설픈 그물코의 텍스트를 남기고 떠나감으로써 한반도에 찾아온 완벽한 변화의 도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언어를 우주적 텍스트로 남겼다. 기독교와 신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언어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인 하나님 체험에 대한 이야기요, 배움과 깨달음의 여정일 뿐이다.
이정용은 종말론적 시대, 포스트 연합감리교회, 포스트 한국교회 시대를 여는 우주종교와 우주론적 인간학의 웨슬리요, 시인일 뿐이다. 그의 시는 곳곳으로 날아드는 민들레 홀씨가 되어 온 세상을 노랗게 물들일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는 이미 이 땅의 삶에서 한반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천망의 인가를 받은 시인이었기 때문이다.
웨슬리가 기독교적 완전을 놓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장로교적 감리교인들과 절연하고, 모라비안 교도들과 절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정용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자기의 신학이 완전하다고 주장할 분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기는 하셨을 것이다. 그 분명한 고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그렇지만 그의 신학은 어설픈 그물코였기에 운명인지도 모른다. 중심을 떠나 구석진 곳의 모퉁이를 찾아갔던 이정용은 그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조우했다는 전설을 나는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다.
그의 신학의 천망, 어설픈 그물코가 통일한국을 열고 세계 선교의 새로운 기독교, 즉 지구촌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영감이 되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정용의 엉성한 텍스트가 천망이기에 미국이란 땅에서 여러 인종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섬기는 어설픈 우리들의 텍스트와 언어로 오늘 체험되기를 기도할 뿐이다. 그것을 어설프더라도 쓰고 갈고닦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소이연(所以然)인 것이다.
그는 신학의 언어를 서구적 언어에서 우주적 언어로 바꾼 혁명적 신학자였다. 그의 시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의 혁명성은 성 패트릭의 아일랜드 선교와 어거스틴의 회심에 비견되지 않을까?
선교는 개인과 민족 선교를 넘어, 결국은 언어와 내면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내면화(inner process) 과정까지 가야 하는 것이다. 즉 사상과 문화적 선교를 통해서 철학화의 지점까지 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문화와 의식의 세계까지 회심을, 만남을 경험케 하려면 언어와 텍스트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심을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맨발로 쫓아가 사울을 항복시켜야 했던 절박한 이유일 것이다. 이정용의 신학을 이렇게 상재하고 싶은 까닭은 나 임찬순의 뇌피셜임이 분명하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있다. 그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건이다.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이들에게는 이정용의 신학적 텍스트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칼 바르트의 하나님인 전적 타자(wholly Other)는 전적 자아(wholly Self)랑 반대 개념이지만, 이정용의 완전한 변화의 도인 그리스도를 전적 자아로 표현하고 싶다. 전적 타자는 초월을 지향하고 하늘과 땅은 화합하거나 만날 수 없는 간극을 갖는다. 그렇지만, 전적 자아는 내재를 지향하고,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다는 믿음과 관계의 유비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정용의 전적 자아는 바르트와는 달리 우주적 종교의 하나님, 즉 전적 타자와 변화의 도를 매개로 결국에는 화해하고 합일하게 된다. 그것은 창조와 구원의 우주적 만남이다. 그것이 우주종교를, 우주론적 인간학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전적 자아는 전적 타자와 일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연합하게 된다. 그것은 외적 공간이나 장소, 제도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다. 이것을 신비적 사고의 궁극처라고 본다. 신비적 사고의 극치는 삼위일체적 사고요, 음양적 사고이다. 창조의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조상들은 개벽이라고 불렀다. 신토불이 하나님의 길이기도 하다.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한반도에 찾아와 소외되고 나라를 잃은 백성을 만나 주시던 그 예수님은 서양과 동양을 하나로 묶어 지구촌 기독교의 탄생을 한반도에서 여닫는 개벽으로 완전한 변화의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닐까? 그 예수님이 한반도를 걸어가실 때 역사 속에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피어났다.
선과 악의 문제도 초월과 내재의 문제도 신과 인간의 문제도 구원과 타락의 문제도 만나고 화합하고 화해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 기독교의 궁극과 창조와 종말의 문제도 모두 여기 이 자리에서 해결된다고 믿게 된다. 그리하여 신학은 돌고 돌아 우주종교가 되었고, 다시 돌고 돌아 우주론적 인간학이 되는 것이다. 전적 타자인 하나님이 돌고 돌아 전적 자아인 인간을 향해 세상에 오심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개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나와 둘과 셋이 화해하고 만나고 노래하는 것도 결국은 이 자리인 것이다. 하나님과 나가 만나고 일치하고 하나가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신비가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다. 결국은 이 신비는 열리고 닫히고 머무르고 비상하게 되는 것이다. 삶과 죽음은 구원과 타락은 시작과 끝은 함께 동거하는 것이다.
신학이 우주론적 인간학이라는 이정용의 고백은 텍스트로서 완성되는 것이다. 텍스트는 날줄과 씨줄로 천이 짜이듯 음양의 운동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 완성은 영원한 미제의 사건이지 고정된 완성이 아니다. 천망이 엉성한 그물코지만 어떤 것도 그 그물을 벗어날 수 없고 얽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나는 기독교의 인간 개념으로 우주적 인간학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화해와 만남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지구촌 기독교의 길을 여는 새로운 신학의 길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거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 글에 영감을 준 이는 이진희 목사님이었다. 이제 번역을 그만하고 자기 글을 쓰라는 비판의 언급을 오래전에 하셨다. 그런 자극이 이 글을 쓰게 했고, 어떤 무의식적 자극으로서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 더 오래된 자극은 대학 시절, 철학과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강의를 들으면서 스트러글할 때, 그래도 가끔 이해가 찾아왔던 강의는 해직되었다 복직한 이명현 교수님의 강의였다. 아마 그의 철학적 논의보다는 유머 섞인 삶의 이야기가 내 속에 다가왔던 듯하다. 김광진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대학 시절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이명현 교수는 “주 없이 쓰는 글”을 이야기해서, 내 속에 하나의 소원으로 간직되어 있었다. 이정용은 30대 초에 그런 시도를 했다.
*** 환갑이 되는 해에 이정용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작은 소망의 표현이다. 용을 그린다고 하다가 강아지를 그린 격이다. 이 글이 말이 되나 걱정이 된다. 비문일 수도 있다.
**** 이 조악한 글을 읽고 피드백을 준 김용환, 임희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임찬순 목사는 서울대 철학과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철학과 종교학을 공부했다. 벨기에 루뱅대학 연수 후, 미국 뉴저지 드루대학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M. Div.)과 박사(Ph. D)를 마쳤다. 현재는 중앙텍사스 연회의 알링턴에 있는 언약교회(UMC of the Covenant)를 섬기고 있다. 재미 신학자 이정용 박사의 제자로 '정용리안(jungyoungleean)'으로 불렸으며, 역서로 줄리아 칭의 <유교와 기독교>, 이정용의 <삼위일체의 동양적 사유>와 마지막 강의를 편집하고 소개하는 <역과 모퉁이의 신학>이 있고, 목회의 현장을 담담하게 담아낸 시집 <바람의 노래, 목자의 노래>가 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