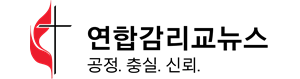유양진 목사, 사진 제공, 유양진 목사.
유양진 목사, 사진 제공, 유양진 목사. (편집자 주: 본 기고문은 연합감리교뉴스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콜롬비아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교인 중에 인하공대를 졸업하고 남가주대학교에서 생화학을 전공하던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저에게 “목사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샴푸와 린스 대신 비누를 쓴다면 환경오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저는 오늘 아침까지 30년 넘게 샴푸와 린스를 사용하지 않고, 비누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평생 샴푸나 린스를 쓰지 않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 주변을 둘러보면, 살면서 겪은 어느 한 가지 사건 혹은 어떤 계기로 신앙관이나 인생관 또는 가치관이 결정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오하우(O'ahu)섬에 소재한 호놀룰루에는 가아와(Kaʻaʻaw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도로변에서 4-50m 정도 들어가 산자락에 자리를 잡은 자그마한 교회인 호프 연합감리교회(Hope UMC)가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40일가량을 머물렀습니다.
머문 지 17일째 되던 날, 저는 교회 뒤편에 있는 산에 오를 수 있는 좁은 길을 따라 무작정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을 찾지 못해 하마터면 어두워진 산속에서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산행을 잊을 수 없는 것은 단지 내려오는 길을 잃고 두려워했었던 이유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깊은 산 속에 형형색색으로 피어 있던 꽃들, 그 이름 모를 크고 작은 꽃들이 산 능선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며,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숨이 멎을 것 같았던 기억과 그 꽃들을 통해 저의 존재의 의미를 뼛속 깊이 새겨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산속에 피어 있는 꽃들은 사람들의 발 길이 닿지 않는 곳에 피어 있어 아무도 볼 수 없고, 또 누구에게 보여 줄 수도 없는 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향이 짙고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꽃들이 하필이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깊은 산 속에 피어 있었을까요? 기왕이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길가나 화려한 궁전 혹은 부잣집 앞마당에 피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깊은 산 속에 피어 있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꽃들은 제자리에서 필 때가 되면 피었다가 질 때가 되면 지면 그만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욕심이고 주제넘은 것입니다. 또한 산속에 피어 있는 이 꽃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아주지 않는다고 앙탈을 부린다거나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그 꽃들은 그냥 제자리에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피었다가 지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만’이기에, 그 꽃이 피어 있는 곳이 깊은 산 속이나 길가이거나 화려한 궁전이거나 또는 가난한 집 마당 한구석이거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폈다 지면 그만인 것을...
미원주민들을 위해, 마치 산 속에 피어 있는 꽃과 같이 살아가는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지(奧地)에서 모든 문명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로 살아가는 미원주민들을 섬기는 분입니다. 그곳의 미원주민들은 가난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병이 들면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분이었습니다.
마치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 선교사님은 버려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었으며,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함께 뒹굴며,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진정한 선교사는 그분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그분의 생활(선교 활동)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렇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선교비(宣敎費)를 지원하려 하는 것마저 정중히 사양(辭讓)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연합감리교뉴스의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연합감리교뉴스의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하여 자신의 사역 위치가 노출되면 선교팀이 일정을 마치고 떠날 때, 자신이 섬기고 있는 미원주민들과 함께 있던 지역을 떠나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왜 좀 더 효과적이고 폭넓은 선교를 위해 다른 사람들처럼 도시로 향하지 않고 자꾸 오지로만 들어가십니까?”
선교사님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Coram Deo)!”
그의 삶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폈다가 지면 그만인 산속에 핀 꽃과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다면, 400명 교인이면 어떻고, 40명 교인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곳이 도시면 어떻고 시골이면 또 어떨 것이며,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왔다가 가면 그만인 것을...
어느 신학교 게시판에서 “시골에는 목사 없는 교회가 많고 도시에는 교회 없는 목사가 많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은 후로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찬송을 한 번도 불러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면 몰라도 ‘어디든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감히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겨울 한파로 인해 피해를 본 교회를 위해, 한교총(회장 이철구 목사)에서 보낸 재난지원금에 대한 영수기이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찍은 사진. 사진 제공, 유양진 목사.
지난겨울 한파로 인해 피해를 본 교회를 위해, 한교총(회장 이철구 목사)에서 보낸 재난지원금에 대한 영수기이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찍은 사진. 사진 제공, 유양진 목사.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특정한 교회로 파송되었을 때, 그 파송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 한 면 전체에 실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첫째, 연합감리교회(UMC)의 파송은 ‘감독의 고유권한’이며, 둘째, 그 파송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사를 읽고 난 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 파송이 “특정 교회”가 아닌 파송되기 전 교회보다 규모도 작고 도시가 아닌 시골로 가야 하는 것이었다면, 그때도 감독의 파송이니 정당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인다고 했을까?
지금 한인연합감리교회, 특히 캘팩 연회에 속한 한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감독의 파송에 대한 부당함 호소나 집단 경고 같은 강력 대응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감독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감독의 파송이 모든 면에 있어 ‘부당'하고, 또 ‘정치적’이며, 설령 그것이 ‘인종차별적’이라 하더라도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감독의 파송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캘팩 연회에서 현역으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교인이 400명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정직’을 당한 후, 저는 교인이 40명 있는 교회에, 그것도 파트타임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 부당한 파송에 대해 ‘이것은 분명히 인종차별이다. 이 부당한 파송에 대해 싸우자’면서 감독과의 싸움을 독려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나는 감독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한 후 감독의 결정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저는 5년 전 자원 은퇴 후, 휴스턴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텍사스 연회의 변방에 있는 1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교회에 파송되어 매 주일 200마일을 왕복하며, 이 교회를 400명이 모이는 교회처럼 열정적으로 섬기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산속에 피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폈다 지면 그만일 것 같던 그 꽃들이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을 살며 노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날 그 산속에 피어 있던 꽃들이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