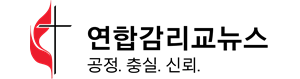공권력에 의한 흑인의 죽음, 유독 미국에서만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지난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46세 흑인 남성 죠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경찰관 4명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가 20불짜리 위조지폐를 가지고 담배를 사려했다는 점원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관 4명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플로이드를 제압하던 중, 한 명의 경찰관이 그의 목을 무려 8분 46초 동안이나 무릎으로 내리누른 결과다. 시민들의 제보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경찰관들이 플로이드의 “숨을 쉴 수 없다(I can not breathe.).”라는 절망적인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클리브랜드, 텍사스 그리고 뉴져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2년에는 흑인 소년 마틴(Trayvon Martin)이 백인 자경단의 총에 맞아 죽었고, 2014년에는 뉴욕에서 에릭 가너(Eric Garner)가 가치담배를 팔다가 백인 경찰에 의해 플로이드처럼 목이 눌려 죽었다. 같은 해 미주리 주 퍼거슨에서는 28세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이,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22세 스테폰 클락(Stephon Clark)이, 2016년에는 미니애폴리스 근교에서 32세 필랜도 캐스틸(Philando Castile)이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졌다.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한 항의와 시위가 빗발치는 가운데 지난 6월 12일 애틀랜타에서는 27세 흑인 남성 부룩스(Rayshard Brooks)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의 잔혹성은 모든 인종을 가리지 않고 행사되고 있다. 하지만 흑인의 경우는 인구 대비 희생자가 유독 많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대다수의 경찰은 버젓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고 있다. 무수한 흑인의 죽음을 초래하는 경찰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현실에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옹호 받는 인종 간의 차별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플로이드가 목이 짓눌린 채 숨 막혀 죽은 이유는 그의 피부색이 검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은 경찰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개인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모든 흑인의 대리적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백인 경찰에게 잔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흑인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찰들을 향한 분노와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플로이드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경찰관의 무릎에 짓눌려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피부색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편견 때문이었을 것이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그 자체는 매우 자연적이지만, 인종차별주의에 오염된 사람은 피부색이 다른 그 자연적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습관적으로 자신의 내부로부터 차별적 감정이 생겨난다. 그렇게 차별적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들이 평소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졌던 관용이나 이해, 배려나 공감 능력은 저하되고, 차별의 대상을 향해 불관용이나 의혹, 무관심이나 비정한 태도를 보이며 야만적이면서도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
19년간 경찰관으로 살아온 한 백인 경찰관과 그의 세 동료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그들이 평소에도 모든 인간을 향해 잔혹성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마도 그들은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좋은 아빠이자 배려 깊은 남편이면서, 정의를 집행하는 것에 소명을 느끼며 살았던 경찰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신자인 나치 친위대 대원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유대인을 향해서는 잔혹한 살인 행위를 퍼붓던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것같이, 나는 그들이 일순간 살인자로 전락한 것이 평소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죄의식 없이 해왔기 때문이라 추측해본다.
이처럼 인간을 향해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게 만드는 인종차별은 사회·문화적 연원을 가지며 권력 구조와도 내밀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인종차별의 감정은 우리 생활 전반에 이미 내제되어 있다.
20세기 전반에 흐르던 인종차별주의적 편견을 국가들도, 기독교도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나치의 인종학살에 반대해 해방군으로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미국 역시 1960년대까지 흑백 차별의 야만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자신을 하나님 은총에 의해 의로워진 사람들이라 여기는 기독교인들은 어떠한가? 이런 비극적 현실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
개신교인들이 정신적 지주처럼 여기는 마르틴 루터도 인종차별주의자였다.
루터가 1543년에 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소책자를 보면, 그는 유대인들을 “독사의 새끼”라 불렀다. 그뿐만 아니라, “눈먼 소경이며, 기만과 속임수와 신성모독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저주했다.
종교 개혁 이후 4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등장한 나치의 정신적 스승이 루터라는 평가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독일 비텐베르크의 한 교회 벽에 새겨진 반유대인 조각, 유대인의 암퇘지(Judensau). 사진, BBC 뉴스 .
독일 비텐베르크의 한 교회 벽에 새겨진 반유대인 조각, 유대인의 암퇘지(Judensau). 사진, BBC 뉴스 .루터의 종교 개혁 성지 비텐베르크성 안에 세워진 한 교회 외벽에는 700년도 더 된 “유대인의 암퇘지(Judensau)”라 불리는 부조(浮彫)물이 새겨져 있다. 거기에는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유대인들과 암퇘지의 뒷다리와 꼬리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고 토라를 읽는 랍비가 새겨져 있다. 누가 보아도 유대인은 새끼 돼지, 랍비는 음란한 자라 낙인찍는 반유대주의적(anti-Semitic) 조형물이다. 이런 조형물을 새겨 둔 교회에서 양육 받은 루터나 나치주의자들이 유대인을 사람이 아닌 더러운 돼지(Schweine)라 여겼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른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브라함 링컨도 인종차별주의자였다. 그는 북부연합의 결속을 짓는 동시에 남부의 결집을 파괴하려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노예 해방을 지지했던 것이지 흑인을 백인과 평등한 존재라 여겼던 인물은 아니었다.
링컨은 1858년 9월 18일 일리노이 찰스톤에서 더글러스(Sen, Stephen Douglas) 상원의원이 그에게 “흑인과 백인을 평등하게 여기는 자”라는 의혹을 던지자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나는 흑인과 백인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일도 찬성할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또한 니그로(흑인을 비하하는 말)들에게 투표권이나 배심원이 될 자격을 준다거나, 그들에게 공직을 맡긴다거나, 백인과 결혼할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생각에 찬성할 마음도 없고 찬성한 바도 없습니다. 덧붙여, 흑인과 백인 사이에 있는 신체적 차이가 두 인종이 사회적, 정치적 평등을 유지하면서 함께 사는 것을 영원히 가로막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두 인종이 함께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함께 지내야 한다면 반드시 우월하고 열등한 지위의 구별이 있어야 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백인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Chicago Press and Tribune, 21 Sep. 1858)
매우 놀라운 일이다. 종교 개혁자도, 민주주의의 아버지도 인종차별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형태의 차별 행위는 힘을 가진 다수가 힘이 약한 소수를 괴롭히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차별하는 이는 차별 받는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평가 절하한다. 여기에 차별의 야만성이 숨어있다. 따라서 우리는 차이를 차별의 이유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가치를 인정하고, 이 차별의 야만성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이것을 오늘의 세계가 요구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라 했다. 인정의 정치는 차이를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즉 “관용의 윤리”를 필요로 한다. 인정의 정치와 관용의 윤리가 결여된 사회에서는 플로이드의 경우처럼 인간이 다른 인간의 가치를 비하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만든다.
종교 개혁 시대나 링컨이 노예해방을 위해 법안을 제정하던 시절에도 명료하게 존재했던 인종차별적 편견은 모든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를 비하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 안에는 인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차별받는 인간의 해방을 몸소 실천한 전통도 이어져 오고 있다.
18세기에 인정의 정치를 실천한 퀘이커들과 웨슬리가 그중 하나다. 웨슬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퀘이커(Anthony Benezet)들과 사상적 교제를 나누면서,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했다. 그는 1774년에 노예제 폐지에 대한 그의 신념을 담은 소책자{Thoughts upon Slavery by John Wesley}를 발간했다. 최초의 노예제를 반대하는 모임이 결성되기 3년 전의 일이다.
 존 웨슬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자(We Love All of God’s Children).”라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 출처, Wellcome Collection.
존 웨슬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자(We Love All of God’s Children).”라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 출처, Wellcome Collection. 웨슬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믿는 퀘이커의 평등주의를 수용하여 인종차별주의적 편견을 극복했다. 이런 까닭에 웨슬리 사상에는 인정의 정치, 관용의 윤리가 깊이 배어있다. 또한, 이런 사상을 품은 웨슬리는 당대의 성차별 문화를 넘어 여성의 영적 지도력을 귀하게 여긴 페미니스트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전통이 어느 사회보다 깊이 배어있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적 비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웨슬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감리교인이라면 인정의 정치, 관용의 윤리를 넘어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경외의 윤리(ethic of respect)를 모든 영역에서 더욱 강력히 실천해야 할 때다.
연합감리교회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회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격주로 발행되는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